
이태영 목사(하늘소리 문화원장)
가끔 구내식당에서 혼자 점심을 먹을 때가 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혼자 식사하고 있어요?”
라는 인사를 받게 된다. 혼자 먹는 것이 뭐 그리 이상한가? 여럿이 먹을 수도 있고 혼자 먹을
수도 있는 것을. 미국 유학 시절, 점심시간이 되면 학교 라운지에 가서 아는 사람이 있으면
함께 먹고 없으면 혼자 먹곤 했다. 혼자 먹는다고 이상하게 보는 사람은 없었다.
오히려 혼자 먹다 옆에 와서 앉는 사람과 이야기하다 새로운 친구도 많이 사귀었다. 그런데
한국에 오니 혼자 밥 먹는 사람을 측은히(?) 보는 눈길이 있다. 그래서 혼자 밥 먹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왜 그럴까? 왕따 문화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혼자 있으면 외톨이가 된 것은 아닌가 하는 나약한 마음이 있기 때문이며, 혼자 있는 사람을
왕따 시키려는 폭력적인 문화가 있기 때문이다. 왕따 당한다고 느낀 적이 있는가? 그렇다면
유대인 왕따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앨버트 아인슈타인은 유대인이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나의 상대성 원리가 사실로 판명
된다면 독일 사람들은 나를 독일 사람이라고 주장할 것이고 프랑스 사람들은 나를 세계 시민
이라고 말할 것이다. 나의 상대성 원리가 거짓으로 판명된다면 프랑스 사람들은 나를 독일
사람이라고 말할 것이고 독일 사람들은 나를 유대인이라고 말할 것이다.” (The New York
Times, 1930년 2월 16일) 보헤미아 출신 오스트리아 국적의 유대인 음악가 구스타프 말러는
“독일 사람들은 나를 오스트리아 사람이라 부르고 오스트리아 사람들은 나를 보헤미아
부른다. 그렇다면 나는 누구인가”라고 스스로에게 물었다.
유대인 역사는 왕따의 역사였다. 중세기 유대인들에게는 거주의 자유가 없었다. 정해진 거주
지역 안에서만 살아야 했다. 이 유대인 거주 지역을 '게토'라고 불렀고 게토라는 낱말의 어원도
여기서 시작되었다. 게토에 사는 유대인들은 두건이나 모자로 신분을 표시하게 하였고, 겉옷에
의무적으로 황색의 유대인 표지를 하게 하였다. 후대에 나치는 독일이나 폴란드 등에 많은
게토를 만들었으며 별 모양의 표지를 윗옷에 표시하여 치욕적인 신분을 드러나게 하였다.
오늘날 이스라엘은 이 표지로 국기를 만들었다. 왕따 표시를 국가의 상징으로 승화시킨 것이다.
근대에 접어들면서 상당수의 유대인이 러시아의 유대인 학살과 유럽의 반유대주의를 피하여
미국으로 이민하였다. 1880년에서 1920년 사이에만 200만 가량의 유대인이 미국으로 이민하였다.
영어를 못했던 그들은 엉터리 영어 발음 때문에 “카이크스(Kikes)”라고 놀림 받았다. '크' 발음을
유난히 많이 하는 유대인을 조롱하는 모욕적인 용어였다.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고작 하루 종일
재봉틀을 돌리는 봉재나 길거리 행상이었다. 1940년대까지만 해도 미국 서부의 말리부 해변에는
“개와 유대인은 출입금지(No Dogs, No Jews)”라는 팻말이 서 있었다. 유대인은 호텔에서도 차별
받았다. 유대인이라는 신분이 밝혀지면 숙박을 거절당했다. 1947년, 그레고리 팩이 주연한 영화
<신사협정(Gentlemen's Agreement)>에 보면 단순히 유대인이기 때문에 차별받는 모습이 잘
그려져 있다.
주인공 그레고리 팩은 신문사로부터 반유대주의에 대한 주제의 글을 써 달라는 요청을 받고 고민
하다가 한 가지 아이디어를 낸다. “나는 8주 동안 유대인이었다”는 르포 형식의 글을 발표하기로
한 그레고리 팩은 사실 자신의 신분이 유대인이라고 주위에 알리면서 예상치 못했던 많은 차별을
경험하게 된다. 유대인이 아니었지만, 글을 쓰기 위해 거짓으로 유대인이라고 신분을 밝힌 후
겪게 되는 왕따 문화는 겉으로는 신사적이었으나 실제로는 은근하고 집요하고 파괴적이었다.
스티븐 스필버그는 미국 유대인이다. 어린 시절 그는 유대인이라서 차별을 받으며 내성적인
어린이로 성장하였다. 훗날 그는 <ET>라는 영화를 만들었다. <ET>는 괴물처럼 생긴 존재라
할지라도 손을 내밀 때 친구가 될 수 있다는 주제를 영화로 만든 것이다.
유대인이라서 왕따 당했던 경험이 오히려 따뜻한 휴먼 스토리의 영화를 만드는 원동력이 된 것이다.
<ET>는 왕따 당하지 않았다면 생길 수 없었던 영화다.
러시아 출신 유대인 화가 마르크 샤갈은 흔히 중력 법칙을 넘어서는 영원한 사랑을 그려낸 화가
라고 평가된다. 그의 그림에는 인간이나 동물들이 하늘에 둥둥 떠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기 때문
이다. 왜 그의 그림에는 하늘에 떠 있는 인간이나 동물이 등장할까? 샤갈은 러시아에서 쫓겨난
유대인이었다.
프랑스에 정착하였으나 마음의 고향은 그가 성장한 러시아의 시골 마을에 있었다. 그러나 샤갈
에게 돌아갈 고향은 없었다. 러시아의 유대인들은 러시아 사람들로부터 왕따 당했으며 학대당했
으며 집단으로 학살되었다. 샤갈의 정체성은 돌아갈 고향이 없어 하늘을 떠도는 사람이었다.
그러나 집단 학살까지 불러온 지독한 왕따도 샤갈의 마음속에 피어오르는 그리움, 사랑, 상상력
을 막지 못하였다. 오히려 왕따의 아픈 기억이 예술로 승화될 때 샤갈 그림 속의 사람들과 연인과
동물들은 하늘을 날았다.
왕따로 고통당했던 유대인, 그중에 아인슈타인이 있고 말러가 있다. 그중에 스필버그가 있고 샤갈
이 있다. 위에서 언급하지 않았지만 카프카가 있고 프로이드도 있다. 그들은 차별을 자신을 더
성찰하고 인간과 세계를 더 깊이 이해하는 기회로 삼았다. 왕따 당하며 이루어 낸, 왕따 당했기에
이루어 낸, 그들의 찬란한 성취를 생각해 보자. 왕따를 이겨 내고 싶은가? 어느 이름 없는 랍비의
말을 기억하자.
“내가 나를 위하지 않으면 누가 나를 위할까? 내가 나만 위하면 나는 무엇이 될까?” 왕따의 폭력
에 굴복하지 말고 나를 위해 그리고 이웃을 위해 어떤 의미 있는 존재가 되자. 왕따의 성공을
이루어 내자.
-최명덕 교수, 즐거운 탈무드-
굿모닝~!!!!!
‘왕따 문화’라는 말이 있듯이 왕따는 사회 전반에 만연해 있습니다.
이번에 GOP 총기난사 사건의 임병장도 집단 따돌림, 즉 왕따 문화에서 비롯됐다고 국방부장관은
시사했습니다. 심각한 왕따를 당해본 경험이 없어서 왕따의 소외에 대해 피부로 느끼지는 못하지만
절해고도의 섬에 홀로 남겨진 모습이 연상됩니다.
사람은 집단동물 이어서 어울려 살지 않으면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그 어울림 속에서 소외당한다면 하루하루 살아간다는 것이 지옥을 맛보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그 아픔을 승화시켜 예술적 작업이나 학문적 성취에 전념한다면 남들이 웃고 떠드는 시간에
위대한 업적을 남기게 됩니다.
왕따는 당하는 사람에겐 분명 아픔이지만 거기에 착념해서 자학하기 보다는 다른 것으로 승화시켜
나가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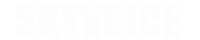



 아침편지- 아픔을 감싸 안은 가족
아침편지- 아픔을 감싸 안은 가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