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태영 목사(하늘소리 문화원장)
내가 기억하는 최초의 작가는 초등학교 시절의 친구다. 소설이나 시를 쓰는 친구가 아니니 작가일
리 만무하지만,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었다는 점에서 당시 내게는 좋은 작가였다. 그 친구 집에 가면
책장 가득 세계문학전집이 꽂혀 있었다. 형제 중 막내였던 내게는 언니, 오빠의 학습 관련 참고서로
가득한 책장만 있었다. 흔한 세계문학전집 하나 없이 어린 시절을 보내는 중이었다. 나는 친구 집에
서 놀 때마다 힐끔거리며 금박으로 빛나는 책의 제목들을 살펴보았다. 제목만으로도 어떤 책은 깊은
아름다움이 느껴졌고 어떤 책은 고아의 슬픔이 느껴졌다. 내가 서가를 기웃거리는 걸 눈치 챈 친구는
세계문학전집을 꺼내어 스스럼없이 빌려 주면서 책에 대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
주었다.
친구에게서 빌려 온 책을 나는 금세 다 읽었는데, 몇
장만 읽어도 친구가 책에 대해 한 이야기가 전부
지어 낸 것임을 알 수 있었다. 몰래 도둑질한 물건을 화원 깊은 뜰에 숨겨 놓은 이야기라던《비밀의
화원》이나, 홍당무를 너무 싫어하는 남자 아이가 그것 때문에 생긴 갈등을 견디지 못하고 가출을
감행해 긴 여행을 하게 되는 이야기라던《홍당무》도 전부 지어낸 이야기였다. 그런데도 다 읽고 나면
두 개의 이야기를 가진 듯 기분이 좋아졌다. 그 후로 내게《비밀의 화원》의 작가는 프랜시스 호지슨
버넷뿐이 아니다.《홍당무》도 마찬가지다. 쥘르나르의 이름 옆에는 그 친구의 이름이
나란히 있다.
제목만으로 유추해 낸 사소하고도 소박한 상상이지만,
그 작은 상상이 하나의 이야기로 직조된다.
그리고 그것을 누군가에게 전한다. 얘기를 전해 들은 누군가는 자기가 얘기를 짓는다면 어떻게 짓겠
다고 상상하기 시작한다. 어린 시절의 내가《비밀의 화원》이나《홍당무》를 다른 친구에게 어떻게
전할지 궁리했던 것처럼. 그러니 빈약한 독서를 어린아이다운 말솜씨로 뽐냈던 친구 역시 작가임에
틀림없다. 작가란 이야기로 누군가의 마음을 건드리는 사람이다. 그 마음을 움직이게도 하고 한자리에
깊이 머물게도 하는 사람이다. 누군가 마음을 만지는 이야기를 해 주었다면, 그리하여 마음에 파동이
생겼거나 같은 자리를 한참 서성이게 만들었다면 그는 작가다. 우리는 누구나 이야기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도 하고 머물게도 한다. 그러니 실은 우리는 모두
작가다.
-편혜영, 소설가-
굿모닝~!!!!!
언젠가 '누구를 화가라고 하는가?'하는 질문과 답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림을 그린다고 다 화가가
아닙니다. 그림을 그린다고 화가라고 한다면 중, 고생 미술반 학생들도 화가라고 불러야 합니다.
취미로 그림을 배우는 성인들도 화가라고 불러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을 화가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질문의 답은 '그림을 팔아서 먹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이 말도 흡족한 답은 아닙니다.
제가 생각하는 화가는 '누군가의 삶에 영향을 주고 감동을 주는 그림을 그리는 사람'입니다.
제가 제자들을 가르칠 때 요구하는 것은 '살아있는 그림을 그려라' 입니다. 어떤 그림은 묘사력은
뛰어난 데 죽은 그림이 있습니다.
그림은 평면에 그리지만 입체감이 표현되어야 하고 움직임이 있어야하고 살아서 튀어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무언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세지가 있어야 합니다.
노래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냥 잘 부르는 사람은 세상에 넘쳐납니다. 저 같은 사람도 음반을
내라는 얘기도 듣고 심지어는 밤무대 가수였냐는 질문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림없는 소리입니다.
음의 높낮이를 마음껏 구사하고 거기에 사람의 마음을 울렸다 웃겼다 하고 적당한 자리에서 멈추기도
하고 꺽기도 하고 악보에는 없지만 감칠 맛 나는 조미료도 칠 줄 아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글도 마찬가지 입니다. 일기가 작품이 되기 어려운 것은 글에는 내용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혼자만의 감동이라면 일기에 기록하면 충분합니다.
많은 사람의 공감을 이끌어 내고 낙심에 빠져있는 사람에게 희망을 주고 바삐 사느라고 깨닫지 못했던
것을 일깨워 주는 메세지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글이 어렵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편지를 씁니다. 자판을 두드리면 글자는 써지지만 이 글이 과연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까,
모르고 살았던 것을 깨닫는 역할을 할까, 쓰레기는 아닐까?
이것이 고민입니다. 어느 날은 소재가 마땅치 않아 여러 시간을 끙끙 댑니다.
안 쓰면 편할 것을 이 무슨 사명이라고 매일 사서 고생(?)합니다.
그래도 제가 쓰는 글을 매일의 일과처럼 기다린다는 분들이 있어서 보람을 느끼며 오늘도 끄적거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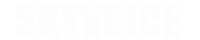



 이태영의 아침편지-고목과 탑
이태영의 아침편지-고목과 탑
 이태영의 아침편지-친구를 말하다
이태영의 아침편지-친구를 말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