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영언 변호사
영주권신청을
준비하는 홍길동씨가 질문합니다. “출생증명서를 한국에서 발급받으면 이를 영문번역한 뒤 공증해 와야 하나요?” 모르긴 해도 많은
분들이 그렇다고 알고 계실 겁니다. 한국의 동사무소에서 받은 출생증명을 위한 기본증명서는 한국어로 작성되어
있으니 미국이민국에 제출하기 위해서는 물론 영문번역을 해야겠지요. 그러나 공증은 필요없습니다.
종종 이민변호사들이 공증된 서류를 부탁하는 이유는 서울의 미국대사관에서 이를 요구하는 관행의 영향도 있고 서류준비에 있어
정성을 기울인 모양새를 주기 위해서이지 꼭 필요해서는 아닙니다. 다만 번역한 사람이 한국어와 영어에 능통하다는
확인과 번역본이 원본의 내용과 일치한다는 확인과 서명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공증제도에 대한 한국와 미국의 차이점을 알아야 합니다.
한국에서 교육을
받고 일정기간 사회생활을 한 사람은 어떠한 서류에 공증을 받음으로써 상당한 공신력을 갖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개인간에 작성한 문서에 공증을 얻음으로써 판결문이나 공문서에 준하는 증명력을 갖게 되어 향후 문제가 발생할 경우 반증이 없는한 유력한
증거가 됩니다. 공증을 하기 위해서는 공증법인을 찾아가야 하는데 대개 법원이나 관공서 앞에 있습니다.
한국의 공증인은 문서작성자의 신원확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문서의 내용에 대해 확인을 해줍니다. 그렇다면 수많은 법률행위의 내용을 이해하고 그 내용의 진정성에 대해 확인해 주는 권한을 아무에게나 줄리가 없습니다.
따라서 공증인은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임명합니다.
내용 확인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있는 만큼 한국에서는 서류의 분량에 따라 보통 수만원 정도의 비용을 받습니다.
미국은 어떨까요. 법체계는 영미법국가와 대륙법국가로 나뉩니다.
그런데 공증에 관한한 미국은 영국과도 또 달라서 전세계에서 가장 느슨한 공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증은 영어로 Notary Public 이라 하는데 미국에서 공증을 통해 확인되는 것은 기본적으로
문서를 작성한 사람이 문서의 말미에 서명하는 사람 본인이라는 사실뿐입니다. 그래서 공증받기 위해서는 신분증을
공증인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즉 공증을 통해 서류의 내용에 대한 진정성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문서의 작성이 서명한 사람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것을 확인할 뿐입니다. 따라서 해외에서 발행된 출생증명서에
번역을 한 뒤 이에 공증을 한다고 그 내용의 진정성이 강화되는 것이 아니니 별도로 요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공증제도를
운영하는 주체는 각 주정부입니다. 따라서 공증인이 되기 위한 요건은 각주가 다릅니다. 일리노이는 미국에서 공증인의 요건이 가장
간소한 주 중의 하나입니다. 영주권자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서와 약간의 비용만 내면 법원등록후 공증인 스탬프를
받습니다. 뉴욕이나 캘리포니아의 경우 간단한 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러나 어떤 주이든 일반인 누구나 할 수 있다는 점은 동일합니다. 미국에는 공증인이 무려
450만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이 공증이 필요한 경우 거래은행이나
회계사 또는 변호사사무실에서 적은 비용 또는 무료로 공증을 받으신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이민국이 자신들이
받을 서류에 공증을 요구하는 경우는 사실상 한가지 밖에 없습니다. I-864 라는 양식인데, 가족초청을 할 때 재정스폰서를
하는 초청자와 보증인이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사실 I-864는 일종의
계약서입니다. 즉 스폰서가 영주권신청자와 미국정부에 일종의 약속을 하는 것인데 여기에 공증을 요구함으로써
본인이 서명해 놓고 나중에 다른 소리 못하게 한다는 취지가 담겨 있는 것이겠지요. 또한 의무이행을 환기시키고
신중을 기하게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김영언 변호사 (법무법인 미래) 847-297-0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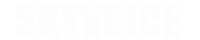



 하재원의 경제 칼럼-독립만세
하재원의 경제 칼럼-독립만세
 경제칼럼-아메리칸 드림의 유지와 계승
경제칼럼-아메리칸 드림의 유지와 계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