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태영 목사(하늘소리 문화원장)
남편과 나는 초등학교에 갓 입학한 두 아이를 데리고 도시로 올라와 작은 식당을 차렸습니다.
방 한 칸 마련할 돈이 없어 식당 한구석에서 아이들을 키우며 살았지요. 저녁에 단체 손님이
밀어닥칠 때는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때 아이들이 눈을 비벼 가며 “엄마, 졸려~.” 하면 정말
난감했지요. 할 수 없이 식당 한구석에 방석을 깔고 아이들을 재웠습니다.
그렇게 365일 매일같이 식당 문을 열었습니다. 시장가서 장을 볼 때도 돈 한 푼이 귀해 아이들
먹일 과일 하나 쉽게 사지 못했습니다. 한번은 과일 가게를 지나는데 검정색으로 변해 가는
바나나가 있었습니다. 주인아주머니는 머뭇거리는 나를 보고 “이거 천 원 주고 가져가세요.”
라고 했지요. '천 원이면 밥 한 상인데….' 하지만 언제 아이들에게 바나나를 사줄까 싶어 눈
꼭 감고 바나나를 샀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온 아이들 앞에 바나나를 내놓았더니 “엄마, 오늘
무슨 날이야?” 하며 맛있게 먹었습니다. “근데 왜 바나나가 노란색이 아니라 검정색이야?”
하고 물었을 때는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그렇게 검정색으로 변한 바나나를 사 주며 아이들을
키웠습니다.
어느새 자란 아들은 취직해서 번 첫 월급으로 내복과 바나나를 사 왔습니다. 그런데 바나나가
새파랬습니다. 내가 “이런 바나나도 있니?” 하고 묻자 아들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릴 때
엄마가 검정색 바나나만 사 오셔서 제일 좋은 바나나로 달라고 했더니 아주머니가 이렇게
싱싱한 바나나를 주셨어요.”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아들은 그 시절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 어려운 시절을 함께 걸어온 남편과 아이들이 있어 오늘도 감사합니다.
-이경자, 충남 천안시 백석동-
굿모닝~!!!!
9월이 되어 가을학기가 시작 되었습니다.
월, 화, 수, 금이 출강일입니다. 오전, 오후 모두 강의가 있을 때는 점심을 사 먹어야 합니다.
시간이 넉넉지 않아 정식 식당에 가서 먹을 만한 여유가 없습니다. 그럴 때 마트에 가서 간단한
요기꺼리를 찾습니다. 빵, 과자, 코너를 뒤지다가 결국 가장 싼 과일인 바나나를 사들고 올 때가
많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는 바나나는 수입품이어서 아주 귀한 과일이었습니다. 우리 집이 제법
살았음에도 바나나 한 개를 통째로 먹어본 기억이 없었습니다. 군대 가던 날 바나나를 먹고
싶어서 어머니께 얘길 해서 혼자서 온전한 바나나를 먹어본 기억이 생생합니다.
큰놈이 어렸을 때인 80년 대 중반만 해도 바나나는 고가의 식품이었습니다. 처의 작은 아버지께서
큰놈에게 바나나 한 속을 사주었는데 지금까지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일이 이제는 천덕꾸러기처럼 싸구려 과일이 되었습니다.
아무려나 한 끼를 해결 하는 데는 구입하기 쉽고 실속까지 있다는 점에서 바나나는 이모저모로
정이 가는 식품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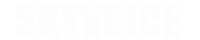



 아침편지-소망
아침편지-소망
 아침편지-격려의 힘
아침편지-격려의 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