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태영 목사
/ 하늘소리 문화선교원 원장>
10월이 거의 끝나갈 무렵, 부산에 살고 있는 친구 집에서 하룻밤 묵게 되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보니 자연스레 늦게 잠이 들었다.
다음
날 나는 사정이 있어서 일찍 올라와야 했기에 기차를 탔다.
피곤한
나는 자리에 앉자마자 잠을 청했지만 사람이 많아서인지 쉽게 잠들지 못했다.
창 밖을
보며 가는데 똑같은 풍경이 지겹기도 하고 따분했다. 그러면서 얼마나 흘렀을까?
잠시
정차했던 청도 역을 벗어나면서부터 비어 있던 내 뒷자리에서 이야기 소리가 나기 시작했다.
누가
탔거니 생각하고 다시 잠을 청하려는데 그 이야기 소리가 끊이질 않는 것이었다.
"와! 벌써 겨울인가? 낙엽이 다 떨어졌네. 근데 낙엽 덮인
길이 너무 예쁘다! 알록달록 무슨 비단 깔아 놓은 것 같아. 밟아 봤으면
좋겠다. 무척 푹신할 것 같은데, 저 은행나무 정말 크다.
몇 십 년은 족히 된 것 같은데? 은행잎 떨어지는 게 꼭 노란 비 같아.
여긴 포도나무가 참 많네. 저 포도밭은 참 크다.
저 포도를
다 따려면 고생 꽤나 하겠는데. 저기 저 강물은 정말 파래. 꼭 물감 풀어놓은 것처럼 말이야.
저 낚시하는
아저씨는 빨간 모자가 참 예쁘네. 저기 흰 자동차가 가네. 그런데 엄청 작다.
내 힘으로도
밀겠어. 운전하는 사람은 음...20대 초반 같은데 안경을 썼네, 어 벌써 자나쳤어!"
겨우
잠들기 시작한 나는 짜증이 났다.
'무슨 사람이 저렇게 말이 많아!
자기 혼자 다 떠들고 있네. 다른 사람들은 눈 없나.'
잠자기는
틀렸다고 생각한 나는 화장실에 갔다가 얼굴이나 보자며 그 사람들을 쳐다보는데 순간 난 잠시 흠칫했다. 그 자리엔 앞을 못 보는
40대 중반 아주머니와 남편으로 보이는 아저씨 한 분이 서로 손을 꼭 잡고 계셨다. 그리고 그 아주머니는 아저씨의 말씀에 고개를 끄덕이며 응수하셨다.
마치
실제로 보기라도 한다는 듯
입가에 엷은 미소를 띠고서.
-보시니참좋았더라2006/11-
굿모닝~!!!!
사람은 밥을 먹고 사는게 아니라 사랑을 먹고 사는 것이 틀림 없습니다.
아무리
가난한 삶을 살아도 가족 간의 끈끈한 정이 있으면 그 집은 반듯이 일어서는 것을 봅니다.
반면
아무리 부잣집이라도 가족 간의 정이 없으면 나중엔 원수보다도 더 못한 콩가루 집안이 됩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 중에 못 살아서 그런 경우는 거의 없고, 오히려 아무 불편이 없을 정도의 재력이 있는 사람이 휠씬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무관심과
사랑의 빛이 안 비친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절망합니다.
절망이라는
어두움의 무게를 떨쳐 낼 힘이 없을 때 스스로 무너지고 맙니다.
사랑받고
있습니까? 엎드려 감사하십시오.
혹시
내 주변에 사랑의 눈길이 필요한데 외면하고 있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요?
남들이
다 손가락질 하는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사랑의 손길을 내밀어 친구가 되어 보시면 어떨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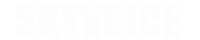



 엄청난 절대 신앙
엄청난 절대 신앙
 미소 짓는 얼굴은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미소 짓는 얼굴은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