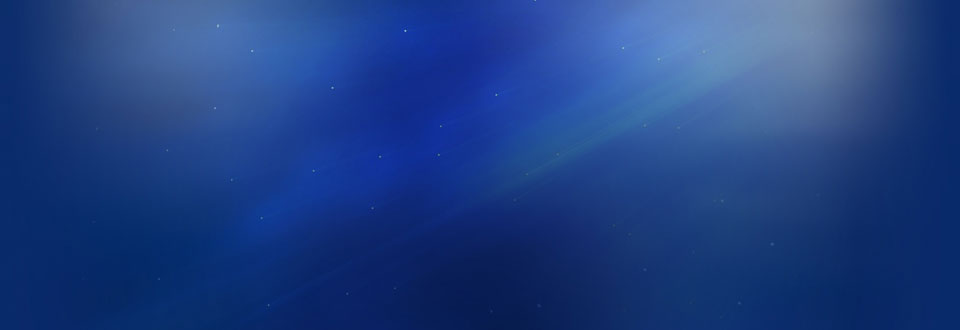<김명렬 / 문필가> 얼마전 나는 시카고에서
오신 손님들과
함께 Key West 에 여행가는 길에 점심 때가 되어 어느
식당에 들렀다. 식사를 하던 중 나는 집사람에게 커피가 너무 써서 그러니 가까이 있는 설탕 그릇을 갖다 달라고 부탁을
했다. 집사람은 일어나서 몇
발짝을 걸어서 카운터에 놓여있는 설 탕 그릇을 갖다 주었다. 그때 식탁에 둘러앉아 식사를 하던 한 분이 “아니 회장님, 그건 웨이츠레스에게 시키시지 왜 사모님께 시킵니까? 회장님, 참으로 겁도 없고 간도 크시네요.”
하고 웃으며 농담을
했다. 요즘 항간에 ‘간 큰 남자 시리즈’가 유행한다더니 집사람에게 편의상 부탁을 한 것이 다른 사람들에겐 아내에게 겁도 없이 심부름을 시키는 간
큰 남자로 비쳐졌나
보다. 간(肝), 우리
몸에는 다른 기관들도 많은데 왜 하필이면 그 소중한 간을 비유하여 이러쿵 저러쿵 농담의
말을 지어내는
것을 보면 동양의학의
사상적 경향때문이란 생각이
든다. 서양의학과는 달리 과거의 우리나라 한국에서는 동양의학을 중요시했고 인체를 ’우주의 축소판’으로 보았던 경향이 있다. 즉 의학의 기술보다는 철학을 좀더 중시해 왔던 것이다. 그러므로 동양의학에서는 신체의 어느
부분마다 각
부분이 담당하는 정신적인 기능이 있다고 보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
생각의 체계
속에서 보통 간이 사람의 배짱을 담당한다고 보는 모양이다. 그런 연유로 좀 배짱이 두둑하게 밀어
붙이는 사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