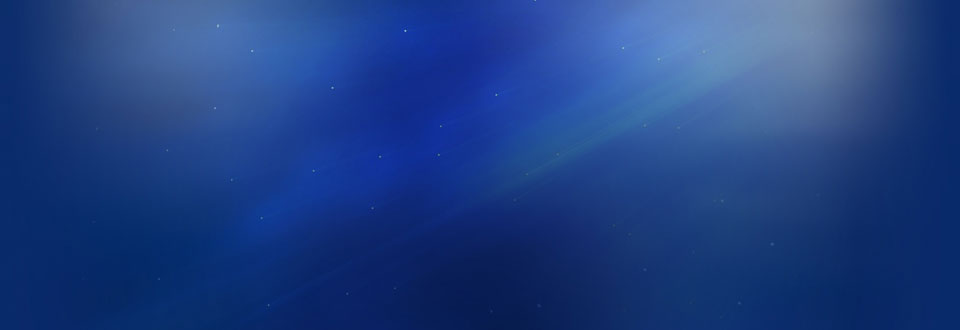<청천 조현례 / 아동작가> 나는 해마다
이맘때 3월 초가 오면 봄은 어디에서
오나 하고 어리석게
사방을 두리번 거리곤
했다. 그리고
살기 바빠서 봄이 오기를 기다렸던 간절한
마음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다가 어느 틈에 꽃샘 바람이
몰아치고 나면 또 한번 봄이 오는 것을 맞이해 보지 못 하고, 아니 잡아 보지 못하고
말았구나 하는 아쉬움이
있었다. 그러면서도 마음 한구석에는 언제나 잡힐 듯 말 듯 하는 나의 봄을 맞이 하고 살아 왔다고 믿고 있었던
것 같다. 어떤 때는 뒤뜰에 있는 가느다란
나무 가지 끝자락에
맺힌 눈, 에메랄드
같은 연초록색의 송곳처럼
간신히 삐져 나오고
있는 새 생명에서
봄을 만났다고 흐믓해
하기도 했었다. 그런데 올해엔
벌써 3월 중순이
가까워 오는데 나는 아직 봄의 입김을
느끼지 못 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내가 너무 성급한 걸까. 나이가 든 탓일까. 아니면 자연에
대한 정감이 나이처럼
어리버리 해진 까닭일까. 난 지금 창밖을 내다 보며 애꿎은 하얀 눈만 바라보고 있다.
그야말로 지난 겨울, 하늘에 있는 눈을 온통 다 쏟아 부은 것 같이 느껴지던 눈만이
나의 시야를 덮고 있을 뿐이다. 그러다 문득 얄궂은 생각이 났다. 혹시 올 봄에 찾아 올, 내가 지금 눈이 빠지게
기다리고 있는 봄이 동장군 처럼 웅크리고 앉아 있는 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