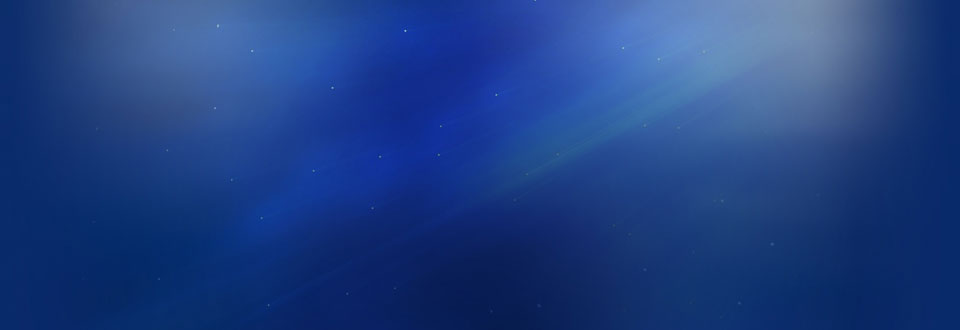<조현례 / 아동 문학가>
꽤 오래전에 들은 얘기이지만 한국에서는 여자들이 밥 먹고 할 일들이 없어서인지, 아니면 팔자가 늘어져서인지 말들을 잘도 지어내는 것 같다. 한마디로 ‘만일 자기 남편이 재산을 억수로 많이 남겨 놓고 일찍 죽어주면 그 보다 더 나은 상팔자가 이 세상에 없다’고들 한댄다.
왜냐하면 늙으막에 남편 시중 드는 시집살이를 안해도 되기 때문이라고 한다. 평생 동안 남편은 돈벌러 나가고 집에 없어서 혼자 편하게 살아 오다가 남편이 일찍 정년 퇴직해서 갈 데가 없으니까 허구헌날 집에서 아내 눈치만 보고 있어서란다.
아내들은 그 동안 남편이 벌어다 주는 돈으로 자기 나름대로 밖에 나가서 친구 만나고 쇼핑하고 부러울것 없이 인생을 즐겼는데 갑자기 남편이 가로걸려서 죽겠는거란 말이지. 그래서 지어낸 볼품 없는 말들이 흘러 흘러 미국에까지 온거란다.
내가 그래도 별로 흥미 없어 하는 표정을 했더니 한 친구가 내 귀 가까이 와서 속삭이듯 귀뜸을 해 주는 거였다.
“알기 쉽게 더 설명하자면..”
며 그 친구는 뜸을 들이는 거다. 그리고 주변을 두리번 거린다. 행여 남편님네들이 들을까봐서다. 그때서야 나의 호기심이 조금 발동하는 것 같았다. 그 친구가 목소리를 좀 낮추며 다시 입을 열었다.
하루 한 끼만 남편 시중 들어 주면 되는 경우에 그 남편은 ’ xx 군’이라고 부른다던가. 그리고 2끼를 (예를 들면 점심과 저녁) 해 드려야 할 경우엔 남편은 졸지에 ’ xx자식’으로 전락 된다.
그순간 나는 언뜻 들었지만 분명치가 않아서 한국 다녀 온 분한테 기회 있으면 한번 다시 물어 봐야지 했었는데 잊어버리고 못물어 봤다. 아직까지. 그럼 3끼 꼬박 해다 받쳐야 하는 남편들은 이 대담 무쌍한 아내님들께서 무어라고 부르셨을까 ? 참으로 궁금하지 않을 수 없지 않은가. 그 쎈 발음은 너무나 선명하게 들렸다. 내 귀에. 그들을 부를 때엔 이름 다음에 붙여주는 <군>자도 <자식>자도 필요 없다는 거다. 숫째 ‘
xxx새끼’로 통한댄다. 참으로 아내들은 눈꼽만큼의 미안함도 가책도 자비심도 없나 보다.
그런데 남편님네들은 왜들 이런 누명같은 억울한 소리를 듣고도 태연한 것일까. 미련하고 둔해서 여자들의 속내를 보여주는 야비한 도전을 전혀 짐작하지도 못하는건지.
마누라가 갑자기 호랑이처럼 무서워진 것일까. 아니면 양반입네 하고 두손 붙들어 매놓고 ‘인생이란…‘ 하면서 시조만 읊조리고 있단 말일까.
이도 저도 아니라면 차라리 발 벗고 나서서 가벼운 부엌일이라도 돕는 척이라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설겆이는 기계가 하니까 먹고 난 빈 그릇쯤은 씽크대 속에 들여다 놓는다든가.
내 남편은 어떤가. 50년 이상을 하루 세 끼씩 밥 해주고 살았는데 감히 밥투정이다. 면전에서 욕 하고 싶을 때가 한두번이 아니다. 어찌 그리 미련하고 답답할까 싶다. 복에 겨워서라고 눈을 흘겨도 알아 차리지 못한다. 눈총을 매번 주고 화를 내보기도 했지만 고쳐지지는 않는다. 나는 우리가 너무 오래 살았고 또 너무 오래 살아 오면서 온갖 맛있는 음식들을 다 먹어 보았기 때문에 비교가 되어 음식 타박을 하는 거라고 스스로 후퇴하고 말았다.
그러면서 나는 세계적인 유명한 셰프들은 우리 한국 청년들을 비롯하여 다 남자들인데 ‘어디 한번 실력 발휘를 해 보지 않겠느냐?’ 하며 선동도 해 보았고 얼러보기도 했지만 내 남편은 절대 마이동풍 격으로 응수할 뿐이다.
남편에게 소개한 세계적인 셰프 한 남자분을 여기에도 소개하고 싶다. 타임지(8.12.13일자)에서 읽은 것이다:
“매트 올란도 (Matt Orlando)는 지난 2013년 7월 17일에 코펜하겐에 식당을 하나 새로 열었다. 그런데 식당을 미처 열기도 전에 1800개의 주문이 쇄도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주문의 25%가 덴마크 밖으로 부터 몰려 들어 왔다는 사실이다. “
나는 남편과의 설전에서 일말의 도움이 될까 싶어 이런 식의 전략을 펴 보았지만 남편은 시큰둥도 안했다. 아마도 내 남편은 속으로 ‘이래뵈도 나는 라면 하나는기가 막히게 잘 끓이니까 굶어 죽을 일은 없을거’라고 생각 했을지도 모른다.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이 60대, 70대, 80대 나이의 한국 남편들에게 향한 아내들의 불만은 어쩌면 우리 한국 여성들이 자초한 결과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도 싶다. 왜냐 하면 그들 한심스런 남편님네들이 아직 어렸을 때부터 미리미리 부엌에 들락날락 하게 가정 교육을 우리 여인들이 시켰었어야 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이제 와서 새삼스레 후회해 봐도 소용 없겠지만 적어도 이곳 미국에 와서 자란 우리 2세, 3세들은 우리가 겪는 것 같은 부부 사이의 갈등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확신한다. 미국에서 살려면 아내도 엄마도 일해야 하는데 날마다 집안에서 우리네 부모님들 처럼 ‘남자는 부엌에 들어가면 안된다’고 아들을 과잉 보호해 줄 옛날 엄마가 없지 않은가.
얼마나 다행한 일인가.’ 잃는 것이 있으면 얻는 것이 있다’라는 간단한 격언이 이런 곳에도 적용이 되는 것 같다.
아무쪼록 우리 헌 (늙은, 오래 산) 세대는 미련 없이 떠나 간 후에라도 우리 후세들만큼은 편안하고 갈등 없는, 우리가 걸어 온 고리타분한 세습은 다 털어버리고 잘들 살아주었으면 하는 바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