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태환 목사 / 시카고 기쁨의 교회>
오랜만에 서울 올라와 만난 친구가
이거 한번 읽어보라며 옆구리에 푹 찔러준 책.
헤어져 내려가는 고속버스 밤차 안에서
앞뒤로 뒤적뒤적 넘겨 보다 발견한,
책갈피에 끼워져 있는 구깃한 편지봉투 하나.
그 속에 빳빳한 만 원짜리 신권 다섯 장.
문디 자슥, 지도 어렵다 안 했나!
차창 밖 어둠을 말아대며
버스는 성을 내듯 사납게 내달리고,
얼비치는 뿌우연 독서등 아래
책장 글씨들 그렁그렁 눈망울에 맺히고.
- 윤중목, <오만 원>
궁색하던 신학생 시절, 처음 만난 목사님이 기차 역까지 직접 운전하여 데려다주셨습니다. 아직 2시간이나 남은 기차 시간, 역 앞 빵집에서 맛난 것 사 주시며 이런저런 이야기 들어주시더니, 떠날 무렵이 되자 책 사 보라며 봉투까지 건네시더군요. 사람을 최선을 다해 대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처음 배운 날이었습니다.
유학생 시절, 가장 친한 벗이 갑작스런 아버지의 소천으로 한국에 들어갔습니다. 함께 갈 수 없는 상황이 미안하여 페이스북에 ‘혹 저를 알고 그 친구를 아는 분이 근처에 계시면 제 대신 조문을 가 줄 수 없겠느냐’ 글을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얼굴도 한 번 본 적 없고 그저 최근에 페이스북 친구 맺은 어느 목사님이 선뜻 ‘제가 가 보겠습니다’라는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제가 감명 깊게 읽은 책의 저자이기도 했던 그분은 정말 한 시간 거리의 장례식장에 저 대신 가서 조문을 하셨습니다. 몇 년 뒤 미국에서 만난 그 목사님은 제 차에 타고 내리시면서 햇빛 가리개 뒤에 봉투를 끼워 두고 가셨더군요. 병석의 아내를 10년 넘게 돌보고 계신 분이 말입니다.
세상이 참 살벌하고 차갑다고 느끼다가도 이런 분들을 만나면 마음이 녹아 내립니다. 그만큼은 못해도 흉내라도 내며 살아야겠다고 다짐 같은 걸 하게 됩니다. 위 시를 자신의 책에 소개한 오민석 작가는 이런 말을 남겼더군요.
“이런 ‘문디 자슥’들이 많은 세상이 천국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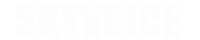



 반년 만
반년 만
 “조금은 커가는 마음” (2020년 7월 19일)
“조금은 커가는 마음” (2020년 7월 19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