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 신 교수>
새벽예배 후 멀리 캐나다 친지가 보낸 카톡을 읽었다. 우선 그 카톡의 일부이다:
큰스님과 작은 스님이 함께 불경을 구하러 천초국으로 향하는 중이었다.
그때 그 둘의 앞에 작은 강 하나가 있어 큰 스님과 작은 스님이 강을 건너려는데 한 아낙이 강을 건너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자 큰 스님이 그 아낙을 업고 강을 건너 주려 한다.
스님이 아낙을 업고 강을 건너서 아낙을 내려주자 아낙은 고맙다는 말을 하고 사라진다.
둘은 말없이 걸어 가다가 작은 스님이 큰 스님에게 묻는다.
"스님은 어찌하여 수련하는 몸으로 아낙을 등에 업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것이 수행자의 올바른 자세입니까?"
큰 스님은 작은 스님에게 말한다;
"난 그 아낙을 아까 내려놓았는데 넌 아직 내려놓지 못하고 있구나!"
이미 지나간 일에 목숨을 거는 건 지금의 현실을 정면 돌파할 배짱이 없다는 뜻일 터.
큰 스님은 아낙을 업었다는 것보다 불경을 찾아 천초국 가는 것이 더 급했고, 작은 스님은 큰 스님이 아낙을 업은 것만 신경 쓰고 있다.
처음 든 내 생각은 작은 스님은 불자의 행동규범 (율법과 규율)에만 얽매인 자. 아니 넘을 수 없는 작은 그릇! 문득, 사람이 안식일 준수를 위해 있는가?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가? 물으신 예수님이 생각났다.
그리고,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가 떠올랐다. 더 정확하게는, 언젠가 읽었던 이 비유에 대한 이현주 목사님의 글이 생각났다. 이현주 목사님이 작은 교회 목회하실 때,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설교하시며 사마리아인은 왜 강도 만난 자를 도왔을까 물으셨다. 설왕설래 끝자락에 한 초등학생이 "혹시 강도 만난 자가 마침 그 길을 지나가던 사마리아 사람이 아는 사람(혹은, 친구) 아니었을까요? 죽어가는 친구를 살리는 것은 당연하지요.” 했다.
나의 ‘친지’ 경계 넘어 사는 어려운 이웃들이 나 (우리)의 친구로 여겨지는 마음. 그래서 나누는 마음이 절로 우러나는 것, 그리고 그들을 살려보려는 행동을 취할 수 있는 용기, 이것이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는 나 (우리) 자신이 간구하고 갈급해야 하는 것이란 생각이 들었다.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을 뿐인) 엘리야로 극심한 가뭄의 고통을 고스란히 겪게 하신 것, 이것이 하나님의 큰 뜻이 있었구나,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열왕기상 17장) 싶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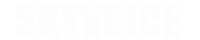



 시편 42편
시편 42편
 나그네를 위하여 남겨 두라
나그네를 위하여 남겨 두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