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태환 목사 / 시카고 기쁨의 교회>
아침에 눈뜨면 세계가 있다
아침에 눈뜨면 당연의 세계가 있다
당연의 세계는 당연히 있다
당연의 세계는 당연히 거기에 있다
당연의 세계는 왜, 거기에,
당연히 있어야 할 곳에 있는 것처럼,
왜, 만날, 당연히, 거기에 있는 것일까,
당연의 세계는 거기에 너무도 당연히 있어서
그 두꺼운 껍질을 벗겨보지도 못하고
당연히 거기에 존재하고 있다
(중략)
당연한 세계에서 나만 당연하지 못하여
당연의 세계가 항상 낯선 나는
물론의 세계의 말은 또한 믿을 수가 없다
물론의 세계 또한
정녕 나를 좋아하진 않겠지
당연의 세계는 물론의 세계를 길들이고,
물론의 세계는 우리의 세계를 길들이고 있다
당연의 세계에 소송을 걸어라
물론의 세계에 소송을 걸어라
(하략)
시인은 정답을 말하지 않습니다. 당연한 걸 당연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당연한 것을 뒤집어 보고 말합니다. 국화빵을 뒤집는다고 하지 않고 눈물을 뒤집는다고 합니다 (정호승). 시인에게 사전은 언어의 감옥이라고도 하더군요. 사전 속에 결박된 단어들을 해방시키는 것이 시인의 역할인가 봅니다. 그래서 김영하라는 분은 “시인은 숙련된 킬러처럼 언어를 포착하고 그것을 끝내 살해하는 존재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시인들은 대체 왜 이러는 것일까요? 세계를 뒤집으려는 것입니다. 언어를 뒤집으면 세계가 뒤집힙니다. 시를 읽을 때, 그동안 당연하다고 믿던 나의 세계가 전복됩니다.
눈을 뜨면 언제나 당연의 세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남들 다 그렇게 사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기는 세상, 그리스도인은 그 당연의 세계를 향해 소송을 거는 사람들입니다. 돈과 명예와 행복에 대한 그 세계의 당연한 가치관과 문화에 대해 딴죽을 거는 삐딱한 사람들입니다. 코로나 19는 일종의 소송입니다. 모두가 당연하다고 믿고 달려가던 그 “물론의 세계”를 향한 소송. 당연한 듯 걷던 삶의 길을 잠시 멈추고, 하늘의 음성과 이웃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묵상의 여정 되시길 빕니다.
<2020년 7월 26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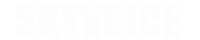



 가을을 향해
가을을 향해
 반년 만
반년 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