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영언 변호사>
골로새에 찾아든 무더위. 루크스(Lycus) 강가에 더위를 식히려 모인 사람들이 가득하다. 골로새 동편 높은산 카드무스 (Cadmus)에서 불어오는 서늘한 바람.
“어디에 이렇게 더 시원한 바람이 드나”
헤매는 인파속에서 홀연히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난 왜 이리 서늘한 바람을 찾고만 있었을까.
예수 믿는게 엄습하는 여름 습기처럼 갑갑하게 느껴진지가 오래이다. 바울 덕분에 경험한 구원의 환희 뒤로 나는 심각한 권태에 빠져 있다. 좁은 길이라고 추종자들에게 벌써부터 따를 길의 성격을 규정한 예수를 원망하고 있다. 자기 부인과 사랑 실천은 제 정신을 가진 사람에게는 멍청하기 이를 데 없이 느껴지는 명령이지 않은가. 불같은 사랑에 빠진 연인에게서나 바랄수 있는 것을. 그런데 사도 요한이 이런 글을 남겼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토록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다름 아닌 신이 그 멍청한 짓을 했다는 것을 증언하고 있다.
오랫 동안 그런 생각을 잊고 지낸 듯 하다. 나도 신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내가 하기에 따라서는 신에게로 서늘한 바람을 일으켜 그의 마음을 기쁘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사랑은 내리 사랑이라지만 그래도 아이가 부모를 배려하여 행동하는 걸 보는 아비의 마음은 뿌듯함으로 가득할 것이다.
새벽을 깨워야 겠다. 다시 사랑하고 싶다. 찌는 듯한 여름 공기는 머지 않아 물러 가고 이내 선선한 바람이 불 것이다. 내가 그 바람이 되어야 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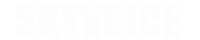



 서른 일곱번 째 이야기: 전능의 유보
서른 일곱번 째 이야기: 전능의 유보
 서른 다섯 번째 이야기: 에베소의 아르테미 신전
서른 다섯 번째 이야기: 에베소의 아르테미 신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