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영호 목사 / 포항제일교회>
인간은 먹어야 산다. 외부의 공급에 의존해 있다는 말이다. 이는 약점이다. 특히 한껏 내달려야 살 수 있을 때, 고립되어 있을 때, 먹어야 삶을 이어갈 수 있다는 조건은 치명적인 약점이다.
그런데 영화 “모가디슈”에서 이 약점은 강점이 된다. 소말리아의 내전으로 서로 협력해야 실낱같은 생존의 희망을 겨우 이어갈 수 있는 남과 북 공관원들이 주인공이다. 유엔 가입을 위한 치열한 외교 경쟁으로 적대감이 팽배하다. 신뢰는 제로이다.
그 냉냉한 사이에 기적처럼 신뢰가 싹 튼다. 함께 밥 먹는 자리에서이다. 남과 북이 마주한 식탁이 일자로 길게 뻗어 있는 밥상이라는 설정이 재미있다. 갑자기 많은 인원이 밥 먹어야 했을 때, 나는 이렇게 앉아 본 적이 없다. 엠티나 친지의 갑작스러운 방문에서 급하게 차린 식사는 대체로 여기 저기 삼삼오오 무질서하게 앉아서 먹기 마련이다. 이 영화에서는 대사는 대사끼리, 부인은 부인끼리 하는 식으로 각자의 카운트파터와 마주 앉은 대형이다. TV에서 자주 보게 되는 남북 (정상)회담 장면을 떠올리게 한다.
영화는 철저하게 소말리아에서 고립된 현장만 보여 준다. 비슷한 영화들은 본국, 이를테면 국방부나 청와대 상황실의 긴박한 말투, 결정의 고뇌, 안타까운 표정을 연결하는데 이 영화에서는 전혀 나오지 않는 것이 특이하다. 완벽한 통신두절이라는 설정 덕분이다. 만약 본국과 실시간으로 연결이 가능했으면 남과 북의 이 신비하고 기묘한 동행이 가능했을까? 영화 초반부터 보고하기 곤란한 상황은 아프리카 오지라는 것을 핑계로 대충 몽개는 장면이 나온다. 이런 틈새는 현실에서는 대체로 태만과 일탈의 계기가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영화에서는 신비한 협력과 신뢰의 기회가 된다.
북한 대사의 당뇨라는 약점은 이 신뢰를 더욱 공고히 하는 기재가 된다. 이 영화의 주제는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인가…
위기 시에 아이들을 데리고 다녀야 하는 것도 약점이다. 그러나 이 영화에서 남측은 북측 사람들이 데리고 있는 아이들 때문에 곤란을 무릅쓰고 문을 열어 준다. 아이들 아니면 벌써 죽었을 사람들. 소말리아 반군 쪽 어린이들이 총 가지고 장난칠 때도 마찬가지이다. 아이들은 목소리로 총을 쏘는 아이들에게 짐짓 쓰러지는 시늉으로 응답해 준다. 뒤늦게 감을 잡은 어른들이 아이들을 어색하게 따라하는 장면, 또 아이들 덕분에 살았다!
소말리아 소년들은 한국인을 죽이고 싶지 않다. 아니 죽일 필요가 없다. 단지 내가 내는 총소리에 겁을 내고 굴복해 주기만 하면 된다. 그게 진짜 총이든 입으로 내는 시늉이든 다르지 않다. 나의 권력이 작동하는 것을 확인만 하면 즐거운 것이다. 어른들의 권력 놀이라고 크게 다를까? 나라와 나라 사이의 전쟁도 그렇고, 대선의 무대에 올라 국리민복을 외치는 이들 중 다수는 이런 놀이를 하고 있는 것 같다.
영화 전체를 통틀어 가장 아픈 부분은 총을 들고 다니는 소말리아 어린이들이다. 고사리 같은 손으로 총질하는 것은 물론, 사람들이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충격이 되는 게 정상이다. 볼 것, 못 볼 것 다 보며 자라는 그 고사리 손 전사들은 어떤 마음으로 자라나게 될까? 반면에 북한사람들이 자기 어린이들의 눈을 가리는 모습이 반복하여 나온다. 좋은 교육은 모든 것을 다 알려 주고 보여 주는 것도 아니고, 할 수만 있으면 불편한 현실을 감추려고 하는 태도도 아닌, 그 중간 어디쯤 있을 것이다.
영화를 보는 내내 지금 아프간의 현실이 겹쳐 보이는 것, 누구나 그럴 것이다. 부모 손 잡고 고국을 떠나는 아이들, 폭력의 현실을 여과없이 감내해야 하는 어린이들의 삶을 위해 기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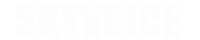



 알리 압둘의 오징어게임
알리 압둘의 오징어게임
 카타콤과 코로나
카타콤과 코로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