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태환 목사 / 시카고 기쁨의 교회>
환승역 계단에서 그녀를 보았다 팔다리가 뒤틀려 온전한 곳이 한군데도 없어 보이는 그녀와 등에 업힌 아기. 그 앞을 지날 때 나는 눈을 감아버렸다. 돈을 건넨 적도 없다. 나의 섣부른 동정에 내가 머뭇거려 얼른 그곳을 벗어났다. 그래서 더 그녀와 아기가 맘에 걸렸고 어떻게 살아가는지 궁금했는데 어느 늦은 밤 그곳을 지나다 또 그녀를 보았다. 놀라운 일이 눈앞에 펼쳐졌다. 나는 내 눈을 의심했다 그녀가 바닥에서 먼지를 툭툭 털며 천천히 일어났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흔들리지도 않았다. 자, 집에 가자. 등에 업힌 아기에게 백년을 참다 터진 말처럼 입을 열었다. 가슴에 얹혀 있던 돌덩이 하나가 쿵, 내려앉았다. 놀라워라! 배신감보다 다행이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비난하고 싶지 않았다. 멀쩡한 그녀에게 다가가 처음으로 “두부 사세요” 내 마음을 건넸다. 그녀가 자신의 주머니에 내 마음을 받아넣었다. 그녀는 집으로 돌아가 따듯한 밥을 짓고 국을 끓여 아기에게 먹일 것이다. 멀어지는 그녀를 바라보며 생각했다.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다. 뼛속까지 서늘하게 하는 말, 다행이다.
- 천양희, <다행이라는 말>
이 낯선 시를 흔한 이야기로 좀 바꿔 보겠습니다. 지체 장애를 가진 여성 노숙인과 아이를 보고 동정심으로 몇 푼의 돈을 건넵니다. 그리고 오늘도 좋은 일 했다며 위안을 삼습니다. 그리곤 그녀와 아기가 어떻게 사는지 궁금해하지 않고 곧 잊어버립니다. 어느 늦은 밤, 툭툭 자리에서 일어서는 그녀를 보곤 배신감에 치를 떱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내 다시는 저런 인간들 돕지 않을 거야.
왜 우리는 한번도 다행이라고 생각해 보지 못했을까요. 정말 다행인데. 그녀가 일어설 수 있어서, 일어서 걸어갈 수 있어서, 그들에게 돌아갈 집이 있어서, 정말 다행인데. 왜 우리는. 왜 나는… 이 시를 소개한 어느 작가의 글을 읽었습니다. 부당한 권력과 싸우다가 사측으로부터 모종의 대가를 받고 가족의 생계를 위해 운동을 포기한 동료를 보며 ‘배신감보다는 다행이라는 생각이 먼저 드는 것’이 그나마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김소영, <별것 아닌 것의 선의>)
배신한 가롯 유다가 자살하지 않고 돌아왔다면 스승은 뭐라고 하셨을까요? 돌처럼 무거운 죄책감 안고서도 가족 먹여살리고자 한 때 뜨거웠던 서원을 포기하고 사는 이들에게 주님은 뭐라고 하실까요? 헌금하고 싶지만 너무 어려운 형편에 그 돈 생계비에 보탠 이들에게 뭐라 하실까요? ‘뼛속까지 서늘하게 하는' 그 말, 아니었을까요?
다행이다. 정말.
--2022년 10월 30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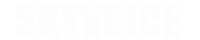



 시를 잊은 성도에게-“다시, 다시는” (나희덕)
시를 잊은 성도에게-“다시, 다시는” (나희덕)
 한 형제에게 보내는 편지 스물두번째
한 형제에게 보내는 편지 스물두번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