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태환 목사 / 시카고 기쁨의 교회>
살다가 살아보다가 더는 못 살 것 같으면
아무도 없는 산비탈에 구덩이를 파고 들어가
누워 곡기를 끊겠다고 너는 말했지
나라도 곁에 없으면
당장 일어나 산으로 떠날 것처럼
두 손에 심장을 꺼내 쥔 사람처럼
취해 말했지
나는 너무도 놀라 번개같이,
번개같이 사랑을 발명해야만 했네
- 이영광, <사랑의 발명>, 『나무는 간다』(창비, 2013)
살다가 살아보다가 더는 버틸 힘이 없어 삶의 벼랑 끝으로 걸어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천 길 낭떠러지 앞에 서서 단 한 발만 남겨둔 이들. 그들의 걸음을 되돌리는 건 ‘나라도 곁에 있으면' 하여 그 곁에 머무는 한 사람의 마음이겠지요. 그가 존재하기를 바라기에 “너무도 놀라 번개같이 사랑을 발명해야만” 하는 절박한 ‘나'의 마음 말입니다. 누군가를 향한 사랑이 이토록 진심이라면 그 사랑은 ‘발견’이 아니라 ‘발명’이 맞는가 봅니다. 그것은 – 적어도 내겐 – 세상 어디서도 본 적 없는 새로운 것이니까요.
무신론자인 어느 문학평론가는 이 시를 “무정한 신 아래에서 마침내 인간이 인간을 사랑하기 시작한 순간의 이야기”로 읽었습니다 (신형철, <인생의 역사>). 저는 이 시에서 ‘나라도 그의 곁에 있어야지’ 하는 선한 마음을 인간 안에 담아 놓으신 하나님의 다정함을 봅니다. 우리 곁에 있으려고 사람의 몸을 입으신, 듣도 보도 못한 사랑을 발명하신 그분의 다정함 말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요일 4:7)
--2022년 12월 11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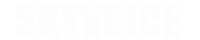



 시를 잊은 성도에게- 인도로 가는 길 / 월트 휘트면
시를 잊은 성도에게- 인도로 가는 길 / 월트 휘트면
 시를 잊은 성도에게-귀/ 장옥관
시를 잊은 성도에게-귀/ 장옥관
